너 없는 하늘아래_
어디서 부터 쓰기 시작해야할까? 연필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새하얀 종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왠지 하얀 종이처럼 내 머릿속까지 새하애지는 기분이였다.
무슨 말을 해야할까? 너에게 어떤말을 전해줘야 하는걸까?
하얀 종이위에 네 이름 세글자를 적었다. 흰 종이위에 적혀진 네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왠지 코끝이 찡하니 아려왔다.
내가 네곁을 떠날때, 너도 이런 기분이였을까?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다.시원한 느낌에 기분이 좋아졌다. 바람이 불어오자 왠지 네가 생각났다. 넌 꼭 바람같았지. 항상 내 곁에 다가올때마다 기분좋은 바람처럼 내 기분을 한껏 들뜨게 만들어 순간의 행복을 선물했지.
그렇지만 그녀는 바람처럼 내 곁을 스쳐 지나가버렸다. 난 그녀를 바람처럼 잡을수도 잡으려 할수도 없었다.
그녀는 결국 바람처럼 내 곁을 떠나갔다. 그녀는 끝까지 돌아보지않았다. 아니, 돌아볼수없었다.
내가 그녀를 찾았을때는 이미 그녀는 바람이 되어 사라진 후 였으니까.
그날, 네가 떠나가버린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너를 찾았더라면, 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얀 종이 위에 연필 끝을 가져다대었다. 무슨 말을 해야할까? 네게 어떤 말을 전해야할까?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다.
' 보고싶어 '
그래, 보고싶어. 정말 미치도록 보고싶고 그리워.
그러나 난 너에게 이말을 전할 수 없었다. 이제와서 전하기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였기에.
' 나 유학가 '
말도 안되는 거짓말. 나는 네가 거짓말치지 말라며 꿀이나 쳐먹으라고 할줄알았다. 그런데 나의 예상과는 달리 너는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었고, 결국 난 정말 너의 곁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곁을 떠나던 날. 잘가라며 무심한듯 어깨를 툭툭 쳐줄줄만 알았던 네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눈물을 뚝뚝흘리며 가지말라고 날 붙잡았다.
네가 울던날, 온세상이 너와 함께 울어주던 날.
너의 슬픔을 알기라도 하는듯 온세상이 너와 함께 울어주었다. 지붕도, 나무도 , 창문도 세상 모든게 눈물에 흠뻑 젖어있었다.
너는 내 점퍼끝을 꼬옥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눈물만 뚝뚝 흘렸다. 울지마. 울지말라며 너를 안아 달래주고 모두 거짓말이였다며. 널 떠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네가 붙잡을수록 나는 더욱 매정하게 너를 떼어내야 했다. 나는 너를 떠나야만 했다.
나는 우는 너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너의 표정을 보면 다시 너에게 돌아가게 될것같아서.
날 붙잡는 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걸었다. 나는 뒤를 돌아볼수 없었다. 돌아보면 마음이 다시 흔들릴것 같아서 나는 너를 돌아볼수 조차 없었다.
너무도 슬펐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다만 심장을 칼로 난도질하는듯 마음이 너무 아팠을 뿐이였다. 그래, 그것 뿐이였다.
나는 그렇게 너를 버리고 떠나갔다.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너의 곁을 떠난지 6개월. 네가 없는 세상은 지옥같았다. 너를 보지 않으면 잊혀질거라는 생각은 헛된 망상이였다는듯 밥을 먹을때도 외출을 할때도 통화를 할때도 잠자리에 들때도 네가 생각나지 않을때는 없었다. 이 세상이 온통 너였다. 네 생각으로 차오를때마다 이러면 안되. 라며 내 자신을 질책하고 너를 버리고 떠난것을 자책하며 그 순간을 매번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렇게 나는 너라는 지옥에 갇혀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금도 이후에도 나는 너라는 지옥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너에게 중독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너라는 지옥에 뛰어들기로 결심햇다.
그리고 너에게 찾아간 그날. 너라는 지옥에 뼈를 묻겠다 라는 생각으로 너에게 찾아간 그날, 나락으로 뛰어드는 너를 보았다.
자동차 경적소리가 내 귀를 울리고 나락의 끝으로 떨어져가던 너와 내가 눈이 마주쳤다. 너는 나를 보곤 나에게 싱긋 웃어보였다.
그리고 네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을때, 나는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듣고싶지 않았다. 들을수 없었다.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다. 내 목소리는 물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날의 너처럼 바닥에 주저 앉아 울었다.
이건 꿈이라며 현실이 아닐거라며 울며 발악했다. 그러나 이건 현실이라며 일깨워 주듯 바닥에 흐르는 피는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색이였다. 네가 좋아하던 선명한 붉은색이였다.
그렇게 너는 내 곁을 떠나갔다.
나는 아직도 너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벗어나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너라는 상처는 내 심장 깊숙히까지 파고들어 아파왔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하얀 종이에 자그맣게 글씨를 적고 끝에 내 이름을 적었다.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편지를 손에 들고 옥상으로 향했다. 붉은 노을이 은은하게 세상을 붉은빛으로 비추어왔다. 그녀가 좋아하던 붉은 색 하늘, 붉은색 세상이였다.
미리 사둔 헬륨가스 풍선 끝에 편지를 매달았다. 높게 날아가서 바람이 되어 떠나간 너를 만나길. 너에게 나의 편지가 전해지기를.
손으로 꼬옥 붙잡고 있던 풍선줄에 서서히 손의 힘을 풀었다.
풍선끈이 내 손바닥을 스치며 하늘로 높이 날아갔다.
높이 날아가서 너에게 닿기를.
붉은 노을이 점점 지평선 아래로 모습을 감추어 가고 있었다.
왠지 네가 사라져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 노을을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바람처럼 너처럼 노을또한 붙잡을수 없었다.
나는 결국 너를 단한번도 붙잡지 못했다. 내 곁에 있어달라며 말하지 못했다.
보고싶어. 나는 너에게 중독되어 헤어나올수 없었다.
중독. 그래 독. 너는 내게 독이였다.
한순간 파고들더니 돌이킬수 없을만큼 깊고 독하게 퍼져들어 헤어나올수가 없었다. 온 몸 곳곳에 너라는 독이 퍼져있었다. 꿈에라도 나와서 헤어나갈 방법이라도 가르쳐주기를 기도 하였지만 매정하게도 너는 꿈에도 한번 나와주질 않았다.
네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생 지옥이였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버텨간다는 표현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 네가 내 곁을 떠나간지 오늘로 100일째지만 나는 아직도 네가 웃으며 내 앞에 나타날것만 같았다. 이 모든게 꿈이였기를 매일밤 기도하고 바랬다.
너 없는 하늘 아래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축소라도 해놓은듯 아래에선 넓고 커보였던 건물들이 이 위에서는 모두 장난감처럼 작아보였다. 이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너는 항상 이 풍경을 보고 있겠지? 지금 내가 보이기는 할까?
세상 경치구경에 정신이 팔려 나라는 존재를 잊은건 아닐까?
씁쓸한 기분이 들어 허허. 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나의 친구이자 우상이자 나의 하늘이자 사랑이였다.
그렇기에 나는 너 없는 하늘아래 살아갈수가 없었다.
그녀라는 하늘이 무너져내린 지금 더이상 나의 하늘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간끝에 서서 눈을 감았다. 뭔가 그리운 향기가 나는 기분좋은 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천천히 한발씩 나락의 끝자락으로 다가갔다.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네가 나에게 화를 낼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내가 너의 곁으로 따라간다면 너를 볼수 있겠지. 그래 그거면 됬어.
다음 생에는 곁에 남을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천천히 나락의 끝으로 뛰어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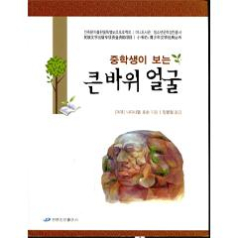 중학생이 보는 큰바위얼굴-人面巨石
중학생이 보는 큰바위얼굴-人面巨石 구술 중국조선족개혁개방40년.2--口述中国朝鲜族改革开放40年 .2
구술 중국조선족개혁개방40년.2--口述中国朝鲜族改革开放40年 .2 被偷走的时光--빼앗긴 시간
被偷走的时光--빼앗긴 시간 삶,그순간의 사색--人生,那瞬间的思考
삶,그순간의 사색--人生,那瞬间的思考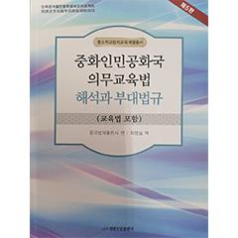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해석과 부입점신청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해석과 부입점신청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2006-08-09 |
33 |
63721 |
||
해피투데이 |
2013-11-30 |
2 |
832 |
|
고소이 |
2013-11-29 |
1 |
902 |
|
xingyu |
2013-11-27 |
1 |
940 |
|
고소이 |
2013-11-27 |
1 |
1351 |
|
물밥 |
2013-11-25 |
1 |
2024 |
|
특별한사람 |
2013-11-25 |
2 |
2595 |
|
리해주 |
2013-11-25 |
9 |
3867 |
|
리해주 |
2013-11-25 |
1 |
2523 |
|
리해주 |
2013-11-24 |
2 |
2778 |
|
리해주 |
2013-11-24 |
1 |
3036 |
|
리해주 |
2013-11-23 |
1 |
2521 |
|
리해주 |
2013-11-23 |
4 |
2660 |
|
동녘해 |
2013-11-22 |
3 |
656 |
|
물밥 |
2013-11-22 |
0 |
1755 |
|
가을낙엽1 |
2013-11-22 |
0 |
1615 |
|
동녘해 |
2013-11-22 |
6 |
2113 |
|
리해주 |
2013-11-22 |
3 |
2936 |
|
뚝딱이가정 |
2013-11-21 |
0 |
1132 |
|
동녘해 |
2013-11-21 |
1 |
783 |
|
리해주 |
2013-11-21 |
6 |
2993 |
|
xingyu |
2013-11-20 |
2 |
862 |
|
특별한사람 |
2013-11-20 |
3 |
2373 |
|
물밥 |
2013-11-20 |
1 |
1813 |
|
2013-11-19 |
1 |
918 |
||
리해주 |
2013-11-19 |
4 |
2911 |
|
리해주 |
2013-11-19 |
5 |
3982 |
|
특별한사람 |
2013-11-18 |
2 |
2513 |
향기는 참 좋은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