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를 탐내도 될까? (63회) 뒤늦게 찾아온 공포.
“근데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시커먼 사내들몇 명이 복도를 지키고 있던데 왜 있는 걸까?”
정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모르겠는데?”
왜 있는지 알 거 같기도 했지만 하정은 허공에 눈동자를 굴리며 짐짓 모르는 척했다.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무서워!”
정연이가 커다란 두 눈을 치켜들고 어깨를 웅크리며 무섭다는 시늉을 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병원인데 뭔 일이야 있겠어?”
도리여 하정이가 그녀의 팔을 툭 건드렸다.
“그런가?”
또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은지 혼자 머리를 끄덕이는 정연이었다.
“정연 누나. 늦었는데 이만 가요. 곧 소등 시간이고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요.”
“아… 그래도,”
“그래. 정연아. 이만하고 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 말고 너네 집으로 가서 자.“
망설이는 정연에 하정도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왜?“
정연이 호기심에 눈이 동그래졌다.
“그게… 요즘 동네가 치안이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나도 없는데 너 혼자서 걱정되어서 그러지.”
하정이 머뭇거리며 차마 저를 납치했던 그 자가 그 자리로 되려 돌아왔을 가봐,라는 말을 못 했다.
저보다 겁이 많은 정연은 하정이가 납치를 당했다는 걸 알면 기절초풍할 게 뻔했으니까.
"뭔 소리야. 그 동네 사건 사고 없이 얼마나 조용한 동네인데 그래."
하정의 타들어가는 속을 모른 채 정연은 피식 웃으며 하정이 침대 끝자락에 털썩 앉았다.
일단, 지금 돌아갈 생각 없고. 조금 있다 가더라도 하정이네 집으로 갈 생각인 게 뻔했다.
"제발, 말 좀 들어. 오늘만 너네 집에 가라고."
뚝뚝 음을 끊으면서 말하는 차가워진 하정에 정연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었다.
"왜애~. 네 집에 내일 회사에 갖고 가야 할 자료도 있단 말이야."
볼멘소리로 툴툴댔다.
"서울아. 미안한데 정연이 데려다줄 수 있어? 먼저 우리 집에 가서 정연이 물건 챙기고 얘네 집까지 부탁할게. 오늘은 일단 그래야 할 거 같아."
어딘가 초조한 얼굴을 한 하정을 마주한 서울은 낮에 일과 관련이 있을 듯하여 알겠다고 했다.
정연은 조금 더 하정에게 부비적대다 간호사가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소등을 하기 시작하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많이 놀랐을 텐데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의사한테 바로바로 말하고. 치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몸이 경직되면서 근육통이라도 올 수 있고. 알았지?”
“응. 알았어. 빨리 가.”
마지막까지 잔소리를 늘리는 정연을 급히 쫓아냈다.
서울도 정연을 데려다준다고 내려갔다.
둘 다 빠지니 시끄럽던 병실이 조용해졌다.
간접 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메인 등이 꺼져 있으니 어둑한 병실이 순간 너무 조용했다. 왠지 으스스한 기운도 도는 것만 같았다.
오싹,
하정이 온 몸에 닭살이 돋았다.
왜 이러지…?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편이 아닌데.
순간, 하정의 하얘진 머릿속에 오늘 낮에 대낮인데도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 어둑컴컴한 폐 공장 안에 묶여 있던 그 장면들이 떠올랐다. 오싹했던 그때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바들바들 떨려왔다.
***
경찰서에서 나올 때부터 내리던 비는 끊을 줄 몰랐다. 7월 내내 거의 내리지 않았던 비 때문에 모든 땅은 바짝 말랐고 지독한 무더위의 연속이었다. 날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더웠지만 말라있던 땅에 드디어 내린 비는 노랗게 익어가던 녹지들과 가뭄으로 걱정이던 사람들에게 더없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기혁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그곳으로 향했다.
이제 제 입으로 진짜 털어놔야 할 타이밍이었다.
아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야만 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건 서로에게 지독한 고문이었다.
구옥 주택들로 즐비한 어느 작은 골목길에 주차를 한 기혁이가 차에서 내려 몇 해 전 은서가 심혈을 기울여 올 수리한 새하얀 벽면으로 둘러싸인 주택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우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대문 앞에 멈춘 기혁이가 빨간색 초인종을 꾹 눌렀다.
“삐—”
가게에 전화를 해보니 어제부터 안 나오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 분명히 집에 있을 은서였지만 인기척이 없는 건 물론 문은 굳건히 잠겨있었다.
집안에 있을 텐데,
은서가 나를 밀어내고 있다.
기혁이 눈매가 한없이 내려앉았다. 거세게 내리는 비에 각지게 정리되었던 앞머리는 힘을 잃고 벌써 그의 이마를 덮어버렸다. 하얀 셔츠가 비에 흠뻑 젖어 상체에 찰싹 달라붙었고 탄탄한 그의 몸을 더 부각시키는 격이 되었다.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은서 역시 나오지 않았다.
기혁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기둥처럼 우뚝 서있었다.
...
은서가 나올 때까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던 기혁이가 그 집 대문 앞에서 자리를 뜨게 된 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정의 신변에 붙여 놓았던 경호원한테서 걸려온 전화 한통 때문이었다.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하정 씨가 어디로 갔다고요?"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병원에서 뛰쳐나갔는데 그 순간 그분이란 생각을 못 하고 잠깐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병실을 확인해 보니 없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일단 근처에 안 보입니다."
전화기 너머 바닥까지 깔린 무거운 음성에 잔뜩 주눅이 든 경호원이 제 잘못을 인정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분이 병원에서 나간 지 30 분 다 돼갑니다."
될 수만 있다면 이 밤에 의뢰인한테 연락을 안 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하정이 때문에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호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탁."
조수석에 제 휴대폰을 내던진 기혁은 거칠게 핸들을 돌렸다.
홀짝 젖은 머리칼 아래로 하정에 대한 걱정이 크게 서려있었다.
"하정 씨! 윤하정 씨!"
병원 근처에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경호원들과 기혁은 하정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그녀를 찾고 있었다. 비는 좀처럼 멈출 줄 몰랐고 저에게 우산을 챙겨주는 경호원을 무시한 채 기혁은 발바닥에 땀이 차게 뛰어다녔다.
설마,
김재중이 또 그녀를 찾아낸 게 아닐까. 또 데리고 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젖은 앞머리를 큰 손바닥으로 쓸어올리며 기혁은 이 어둑컴컴한 밤에 어디에 있을지 모를 하정을 걱정하며 가슴을 조였다.
"지이이잉."
손아귀에 꽉 잡혀있던 기혁이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윤하정>
화면에 뜬 이름은 기혁의 눈을 한 번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
전화는 진작에 많이도 걸었었다. 그러나 한참을 울려서 들린 건 소리 샘으로 이동한다는 안내음 밖에 없었다.
"윤하정 씨?"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조차 사치라 생각한 기혁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그녀인지 조심스레 확인했다.
"대표님...."
잘게 떨리는 음성이 저를 부르자 바짝 조여왔던 기혁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적어도 김재중 그 자식한테 다시 잡힌 게 아니었다.
"어딥니까, 윤하정 씨."
이제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면 된다.
"정신없이 뛰어나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가까운 곳이긴 한데... 골목길이에요."
전화기 너머 울먹이는 하정이 목소리가 참으로 가련하게 들렸다.
"기다려요.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하정 씨를 부르면서 찾을 거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
"윤하정 씨?"
"네... 빠, 빨리요."
더듬거리며 빨리 오라는 하정의 그 말은 많이 다급해 보였다.
"알겠습니다. 전화는 끊지 말죠."
이 말을 끝으로 기혁은 더 큰 보폭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간다는 말을 반복하며, 한편으로는 하정의 이름을 떠나가라 불러댔다.
이윽고 몇 번째의 골목길인지는 모르나 꽤 많이도 뛰었을 무렵,
휴대폰 속에서 들리던 기혁이 목소리가 가까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하정이가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골목길에서 뛰쳐나갔다. 다른 골목으로 가야 하나 몸을 돌리려던 기혁의 시야에 비에 흠뻑 젖은 그녀가 들어왔다.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이 뛰쳐나온 건지 맨발인 하정이가 기혁에게 가려고 한 발을 내밀었다.
"잠시만, 거기서 기다려요."
흠칫,
움직이려던 하정을 불러 세운 기혁이가 저벅저벅 큰 보폭으로 그녀의 앞에 금방 다가섰다. 아무 말 없는 기혁이가 신발도 없이 뛰면서 생긴 하정의 발의 상처를 확인했다. 가슴이 미어질 듯이 저려왔다.
"이게... 뭡니까. 대체..."
말을 잇지 못했다. 뒤돌아서 무릎을 내렸다.
"업혀요."
잠깐 머뭇하던 하정은 저를 잡으려고 긴 두 팔을 등 뒤로 뻗고 있는 기혁의 널다란 등에 몸을 밀착 시켰다. 흠뻑 젖은 옷이 몸에 더 바짝 닿으면서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 못지않게 쫄딱 젖은 그의 축축한 등이 싫지 않았다. 정신없이 떨리던 몸이 차츰 진정을 해가고 있었다.
병실에서 어떻게 뛰어나왔는지 모르겠다. 그저 그 어둑컴컴한 공간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잡히면 큰일이니까,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혁이가 병원 앞에 다다르자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던 하정의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병원 앞 화단 위로 하정을 내리고 그녀와 마주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하정의 표정을 보고 싶어 기혁의 커다란 손바닥이 하정이 뺨을 감싸 쥐었다. 살짝 올라간 고개로 드디어 눈물을 머금은 하정의 그 공허한 두 눈망울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저기 들어가기 싫어요."
울먹이며 겨우 꺼낸 하정의 말이었다. 기혁은 고개를 끄덕이었고 심하게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당겨 끌어안아주었다. 아주 늦은 박자로 하정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연신 "이제 괜찮아."를 반복했다.
...
기혁은 곧장 그 길로 저 자신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하정이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일단 안 될 거였고 호텔 같은 곳은 하정을 일일이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흐트러져 있는 하정을 데리고 갈 곳은 한 곳뿐이었다.
하정은 기혁의 등에 업혀 그 집에 들어섰다. 기혁을 빼고는 누구도 없던 집안에 어느새 그가 미리 부른 여러 명의 고용인들이 갓 현관에 들어선 기혁이와 하정을 맞이했다.
"따뜻한 목욕물 준비되었죠?"
기운을 못 차리는 하정을 소파에 내리며 기혁이 그중 한 명한테 물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만족스러운 답을 들은 기혁은 머뭇거릴 하정을 마주 보며 달랬다.
"옷이 다 젖었으니 욕조에 따뜻하게 몸을 담가요. 움직이기 힘들면 여기 이모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정이 말없이 조용히 있자 기혁이가 이모라 부르던 중년 여자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하정의 몸을 부추기며 화장실로 이동했다.
 중국조선족추석--中国朝鲜族中秋节
중국조선족추석--中国朝鲜族中秋节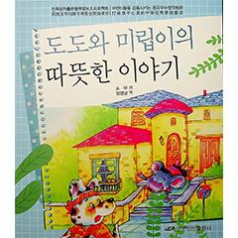 도도와 미립이의 따뜻한 이야기-淘淘和米粒的温情故事
도도와 미립이의 따뜻한 이야기-淘淘和米粒的温情故事 基于语义框架的汉韩动词对比及教学创新模式研究--중한 나눔 동사
基于语义框架的汉韩动词对比及教学创新模式研究--중한 나눔 동사 1.2.3 수자 --早教第一卡 数数
1.2.3 수자 --早教第一卡 数数 认数-셈 세기입점신청
认数-셈 세기입점신청
잘 보고 갑니다 ㅎㅎㅎ
잘 보고 갑니다 ㅋㅋㅋ
잘 보고 갑니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 ㅋㅋ
잘 보고 가요 ㅎㅎ
잘 보고 가요 ㅋㅋ
ㅎㅎㅎ
ㅋㅋㅋ
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
ㅎㅎ
ㅋㅋ
ㅋㅋ
ㅎ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