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를 탐내도 될까? (68회) 나 그 사람 못 잊어.
“하정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납치라니!”
정연은 병원에 있던 하정이가 어젯밤에 대표님 집에 갔었다는 건 퇴근 직전에 알았다. 곧장 하정이네 집으로 달려왔다.
원래 퇴근하고 하정이가 있을 병원에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퇴근 직전, 이한이가 찾아왔고 하정이가 집에 돌아간지 얼마 안 되었으니 오늘 하정네 집으로 가서 같이 있어주라고 했다. 납치범은 잡혔지만 하정이 혼자 있기 힘들어할 수가 있다고 했다.
납치범이라니?
이한은 미리 말하지 못한 거에 미안하다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친구한테 그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저 자신은 출근이나 하고 있었다니.
“어… 알았구나.”
“허, 알았구나? 너 내가 몰랐으면 끝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할 생각이었어? 그렇게 큰일이 일어났는데??”
멋쩍게 웃어 보이던 하정에게 정연이 버럭 화를 냈다. 그러나 이내 뾰족하게 세웠던 날을 거두었다. 하정이 얼굴은 어제 봤을 때보다 왜 이리 더 수척해진 건지. 밤새 많이 아팠겠구나 싶었다.
“하정이 너에게는 참… 왜 이런 일만 생기는지…”
정연이 눈물을 삼키며 울먹이자,
“이것도 경험이지 뭐~”
속 없이 웃는 하정이를 보니 더 마음이 아팠다.
“너 그렇지 않아도 아픈 사람인데…”
“정연아. 나 좋은 소식 있어.”
하정의 두 눈이 반짝이었다.
“응?”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글쎄 내가 치매가 아니래. 오진이었어!”
“응??!”
정연이 벌떡 뛰며 일어섰다. 얘가 안 좋은 일을 당하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나 싶었다.
“진짜야. 다른 사람이랑 차트가 바뀌었대.”
다시 한번 올곧은 하정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정연이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정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정말. 내일 병원에 다녀올 참이야.”
“그럼 나도 같이 가.”
“너 회사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회사가 중요해?! 만일 진짜 병원에서 실수를 한 거라면 가서 엎어야지!”
정연이 또 화를 냈다.
“엎긴 뭘 엎어. 이제 와서 오진이었다는 게 난 얼마나 고마운데.”
하정이 헤헤 웃었다. 부르튼 입술을 해갖고.
“윤하정 너 변했어. 불이익 같은 건 절대 못 참고 마구 덤비던 넌 어디에 간 거야!“
”뭐야. 갑자기…“
”그리 약해 빠지지 말라고. 난 네가 변하는 거 싫어.“
날을 세우는 정연의 그 말에 하정은 눈만 깜빡댔다.
”딩동-“
아닌 밤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둘의 시선은 인터폰 화면으로 향했고 정연이가 걸어가서 확인했다.
“어? 서울인데?”
정연이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어느새 하정이가 정연의 팔을 잡아버렸다. 의아한 정연이가 저를 멀뚱히 쳐다보자,
”내가 나갈게. 서울이랑 할 얘기가 있어.“
”어? 어… 알았어.“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왜…
아, 어제 대표님 집에 가서 그걸로 사이가 안 좋아졌나..
정연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현관에 멈춰 잠깐 긴 숨을 들이켜던 하정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고는 바로 닫아버렸다.
”누나.“
벽에 기대서 머리를 푹 떨구고 있던 서울이가 하정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그녀를 안으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하정은 바로 뒷걸음을 쳤다.
잘게 떨리는 아련한 눈동자가 그녀를 갈망하며 허덕이고 있었다.
“많이 마셨어?”
훅 들어오는 알코올 향에 하정이가 담담하게 물었다.
“응, 아니.“
서울은 말을 번복했다.
”내가 미안했어. 누나. 힘들었을 누나를 다독여주기는커녕 그 사람 집에 갔었다고 심술을 부리고 화낸 건 내 실수였어. 용서해 줘.”
가늘어져 있는 그의 눈과 마주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바짝 긴장해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 기세였다.
“서울아. 난…”
서울이 성큼 하정의 앞으로 한발 내디디며 하정의 허락 없이 와락 끌어안았다.
”질투가 났어. 그래서 누나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아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는 말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누나를 이해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차츰 또렷하던 말이 흐릿해지는 듯했다. 하정은 손바닥을 뻗어 서울의 가슴팍을 밀어냈다.
양볼에 이미 흘러내린 서울의 눈물을 보았다.
”서울아…“
하정의 가라앉은 눈동자와 차분한 음성에 흥분하기 시작한 서울이가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난 서울이 네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알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난 누나를 좋아하고 누나도 내가 좋은 남자라 생각되면…“
서울은 조급했다. 아무래도 아픈 하정에게 화를 낸 건 큰 잘못이었던 거 같았다. 저를 용서할 때까지 빌고 또 빌 생각으로 여기를 찾아왔다. 술기운도 빌리고.
“나한테 박서울은 과분해. 나에 대해 잘 아는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근데 있잖아… 서울아.”
하정의 두 눈엔 슬픔이 배어있었다.
아니야.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서울은 불안했다. 하정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일지 알 것만 같아서.
”서울아. 네 말대로 우린 이런 관계를 끝내야 해. 아니, 시작한 자체만으로도 너한테 상처가 되었으니 내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하…
서울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술을 정신없이 들이켜서 걸음걸이가 비틀 거릴 정도였지만 그 독한 술을 벌써 깨는 기분이 들었다.
발간 볼 위에 처량해진 두 눈동자는 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처로 가득했다.
“나를 그저 이렇게 밀어내겠다고? 난 누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난…”
“서울아. 난 8살이었던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 우린 어렸지만 가장 힘들 때 서로의 버팀목이었었다는 게 나한테는 정말 좋은 기억이었어. 그런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할 일이야. 나는 다시 만난 너에게 불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만 생각하면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정은 긴 얘기를 서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고 했다. 절대 피하지 않는다는, 내 마음은 이걸로 확고해졌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서울에게 각인시켜주려고 했다.
되려 서울이가 그런 하정의 눈을 피해버렸다. 아무 것도 못 들은 척 꾹 닫혔던 입을 벌렸다.
”난 누나한테 욕심을 안 부릴 거야. 욕심을 낸다고 해서 안 될 거란 잘 알고 있으니까.“
벽에 꽂혔던 시선을 하정에게 돌린 서울이가 말을 이어갔다.
”난 계속 말했 듯이 누나가 내 곁에 있기만 한다면,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크나큰 위안이야.“
하정이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곁에서 사라지겠단 말 아니야. 난 여전히 네가 아는 누나고 넌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서울이야. 친구처럼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
서울의 흔들리던 두 눈동자가 멈추었다.
“이제 와서 누나가 어떻게 내 친구가 돼.“
여전히 상처받은 얼굴인 서울을 훑은 하정이 고개를 떨구었다.
”… 미안해. 내 잘못이야.“
서울은 하정의 양어깨를 부여잡았다.
“난 누나를 사랑해. 누나랑 친구 하기 싫어.”
하정이 그런 서울의 팔을 밀어냈다.
“나 그 사람 못 잊어. 나한텐 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사실이기도 했지만 굳이 이런 자극을 주는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던 하정의 입에서 결국 서울의 속을 긁을 말들을 뱉었다.
흔들리는 서울이 두 눈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누나…”
눈물이 점점 차올라 앞에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하정의 얼굴이 잘 안 보였다.
어깨가 들썩이었다.
어린애처럼 떼를 써서라도 하정을 제 옆에 두고 싶었다. 그 정도로 하정이가 좋았으니까. 얼마 안 되었지만 하정의 남자친구였던 그 며칠이 서울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으니까.
그 행복의 끝이 뭘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다.
서울은 하정이가 제 곁에서 떠날 거라는 걸 사실 알고 있었다. 그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잘해주기만 하면 하정이도 언젠가는 그 사람을 잊지 않을까 싶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끝을 얘기하는 하정과 마주하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보쌈을 해서라도 하정을 영영 그 사람하고 떨어뜨리게 하고 싶어졌다.
안 좋은 일을 겪은 하정에게 저마저도 이런 나쁜 생각이 들었다는 거에 자책을 하면서…
서울은 잘 가라는 말만 남긴 채 매정하게 집으로 들어간 하정을 잡지 못했다.
비틀거리는 몸을 벽에 기댔고 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떨렸다.
***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기혁이가 무거운 제 몸을 펜트하우스에 집어넣었다.
현관에서 느낀 집안은 너무 조용하다.
오늘 낮에까지만 해도 하정을 돌보는 고용인들로 조금은 복닥거리는 기분이 들었었다.
다시 커다란 이 공간에 혼자 남았다. 맨날 이랬던 제 집인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투둑, 비에 젖은 구두가 기혁의 발에서 겨우 떨어져 나갔다.
"왔니?"
누구도 없어야 할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다.
2층 계단에서 사뿐히 내려오는 이가 있었다.
몸에 딱 맞는 핑크색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덮는 화려한 패턴의 스커트를 입은 주인공은 기혁의 어머니, 연화였다. 수려한 외모와 함께 잘록한 허리를 꼭 잡아준 벨트는 아직도 굴곡 있는 그녀의 몸매를 더 과시해 줬다.
"너 요즘 비를 맞는 데에 재미 들였니?"
비에 홀딱 젖은 제 아들을 본 연화가 입으로 쯧 하는 소리를 냈다. 저한테 여럿의 귀와 입이 있는 연화는 진작에 아들이 어제 비에 홀딱 젖은 채로 이 집에 누구랑 들어섰는지 들었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전혀 반갑지 않다는 기색을 팍팍 드러낸 기혁이가 딴 소리로 대꾸했다.
"뭐, 비번이야 이 실장한테 물으면 되는 거였고. 한 집사한테서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집에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걸 꺼려 하는 네가 갑자기 가정부를 들였다 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 와 봤지."
"이제 다 보냈으니까 더 궁금해하지 마시죠."
여전히 차가운 기혁이 모습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연화는 소파에 살포시 앉으며 팔짱을 느슨하게 꼈다.
"씻고 나와. 할 얘기가 있어."
"..."
탐탁지 않은 얼굴을 한 기혁이가 어쩔 수없이 욕실로 향했다. 금방 샤워를 끝내고 옷을 갈아입은 기혁은 연화의 앞에 털썩 앉았다.
"할 얘기, 빨리하고 가시죠."
연화가 마주한 기혁은 얼굴에 피곤과 수심이 가득했다. 이마를 다 덮은 젖은 까만 머리칼은 단정하다 못해 차갑게 느껴지던 평소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직도 손을 뻗으면 엄마! 하고 달려들던 그 해맑고 어렸던 아들이 생각나 연화의 가슴이 일순간 설레었다.
"우리 아들 잘 생겼다."
뜬금없는 칭찬에 기혁이 연화를 힐끔 쳐다보았다.
무슨 꿍꿍이길래 실없는 칭찬부터 할까 괜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나를 닮아서 정말 재미있는 아이였는데.... 언제 이렇게 차가운 남자로 변했지?"
연화가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변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새삼 서러울 정도로 아까웠다. 아들의 옛날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할 말 없으시면 그만 가시죠. 저 피곤하니 들어가서 쉴게요."
기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윤하정 말이야."
연화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 기혁이가 천천히 다시 눈을 떴다.
또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러는지 알 길이 없었다.
"저번에 윤하정 가족을 만나봤다. 태국에 살고 계시더구나."
허,
할 일이 없으신 분은 맞지만 그렇게 할 일도 없나 싶을 정도의 말을 들은 거 같았다.
기혁의 짙은 눈썹이 일그러졌다.
 70후 조선족작가 소설선집--70后朝鲜族作家小说选
70후 조선족작가 소설선집--70后朝鲜族作家小说选 ㅎ 조선어자모 들춰 카드14 朝文字母翻翻卡14
ㅎ 조선어자모 들춰 카드14 朝文字母翻翻卡14 쪽파 무침 500g
쪽파 무침 500g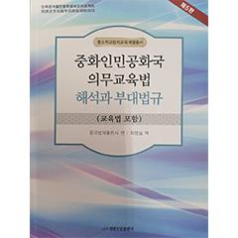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해석과 부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해석과 부 本草纲目 第二卷--본초강목 제2권입점신청
本草纲目 第二卷--본초강목 제2권입점신청